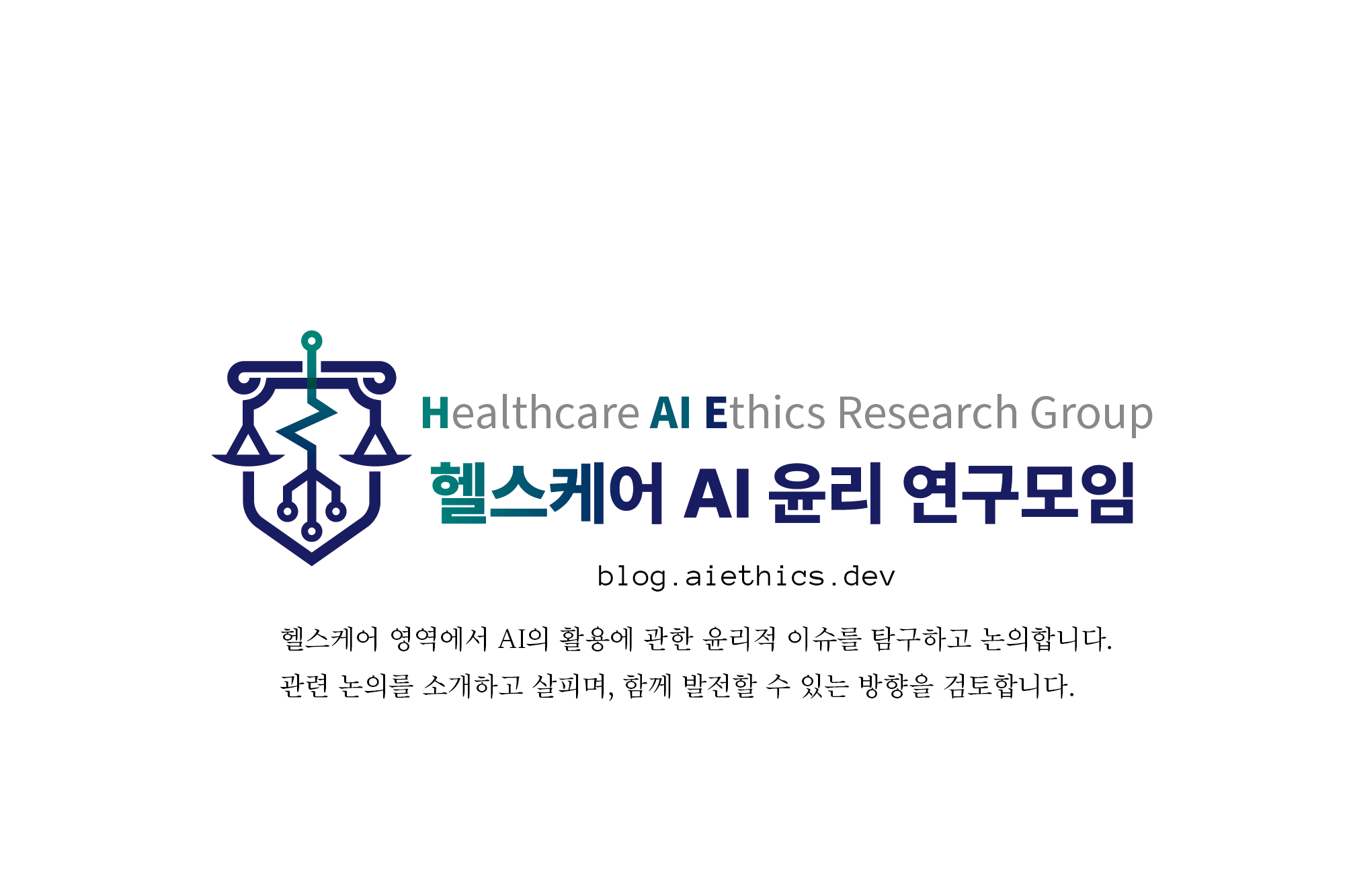인공지능 시대의 돌봄과 존엄 [HAIE 2025-44]
이번주엔 여러 논문 중, 같이 읽어보고 싶은 논문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말기 돌봄에 AI 및 전자 기록이 미칠 영향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한 논문이고, 다른 하나는 AI ECG, 즉 AI 기반 심전도 기기의 비용효과성을 중국 농촌 지역 대규모 자료로 검토한 논문입니다. 한줄 요약만 봐도 흥미로운데요!
![인공지능 시대의 돌봄과 존엄 [HAIE 2025-44]](/content/images/size/w2000/2025/10/photo-1560696788-83c0ca339eea.jpeg)
들어가며
추위가 질주의 숨을 잠시 고르는 사이, 경주, 야구, 주식이 나라 전체를 들썩하게 한 한주였네요. 잘 지내셨나요? 헬스케어 AI 윤리 뉴스레터 김준혁입니다.
이번주엔 여러 논문 중, 같이 읽어보고 싶은 논문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말기 돌봄에 AI 및 전자 기록이 미칠 영향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한 논문이고, 다른 하나는 AI ECG, 즉 AI 기반 심전도 기기의 비용효과성을 중국 농촌 지역 대규모 자료로 검토한 논문입니다. 한줄 요약만 봐도 흥미로운데요!
첫 논문은 점차 환경 지능(ambient intelligence)이 돌봄 환경에서 당사자의 발화를 자동 녹취, 기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시점에서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어요. 과연 말기 돌봄에서 비판적 검토 없이 환자, 가족, 의료진의 대화를 그냥 녹취해도 괜찮냐는 거지요. 특히, 논문은 이럴 경우 환자가 사망한 다음에 환자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기록 및 분석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 환경 지능: AI 기반 transcription 시스템이 배경에서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이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흔히 (법적) 자기결정권으로 축소되어 이해되는 존엄성/자율성을 AI를 배경으로 해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결정권이라면 사실 사망 이후에 행사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은 그에 충돌해요. 죽은 뒤에도 우리는 고인의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무언가"를 논문은 "사후 전기적 존엄(post-biographical dignity)"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이야기는 존엄한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AI가 알고리듬으로 요약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제대로 취급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논문은 28만(!) 사례를 기반으로 AI 심전도의 비용효과 분석을 시행했어요. 검진하지 않는 것과 의사가 직접 검진하는 것에 비해 AI 심전도의 비용효과가 낮다는 것을 대규모 자료로 실증적으로 제시합니다. 저희로선 얻기도 어려운 자료 크기에 한번 놀라고, 매번 "AI 보건의료가 더 저렴할 걸?"이라는 추측을 현실에서 증명하는 결과이기도 하지요.
일차 검진 차원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한편 주목할 만한 발전이자 보건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임은 분명하지만, 몇몇 이론가가 외쳤던 공정성이 정말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논문은 이를 수치로 증명합니다. 단, AI 검사는 말 그대로 일차 검사 또는 선별 자료일 뿐, 양성 결과가 나왔을 때 효과적으로 전문의 의뢰로 이어질 수 있어야만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논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결국, "AI를 쓰면 돼"가 아니라 어떻게 AI를 현재 워크플로의 변화에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문은 또한 보여주고 있는 셈이에요.
다른 논문도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선생님들을 위해 요약을 정리했으니 같이 봐 주셔요!
이번주 주목할 만한 소식
AI 시대, 삶의 기록을 넘어선 존엄: 서사와 ePROMs/ePREMs가 제기하는 임종기 돌봄의 윤리적 과제
논문 요약
From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Post-biographical dignit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Narrative, ePROMs and ethical challenges in end-of-life care[1]
본 논문은 AI와 ePROM/ePREM이 말기 돌봄의 경험을 데이터로 환원할 위험을 지적하며, 죽음 이후의 디지털 흔적과 기억까지 포함한 ‘사후 전기적 존엄(post-biographical dignity)’ 개념을 제안해요. 경청은 자동화될 수 없고, 알고리듬은 치료적 관계를 보완해야지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동의·삭제권·공정한 재현을 보장하는 정책적 장치를 촉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서사·관계·기억을 중심에 둔 다학제 윤리 프레임을 말기 돌봄에 적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ePROM (electronic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ePREM (electronic Patient-Reported Experience Measures): 전자 설문 기반 환자 경험 평가
왜 읽어야 해?
말기 돌봄에서 AI와 ePROM이 환자의 서사를 위험 점수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경고는 임상·정책 설계를 재고하게 만들지요. 저자는 존엄을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디지털 사후 존재까지 확장해, 동의·삭제권·재현 규범을 핵심 윤리 과제로 제시합니다. 경청의 비자동가능성과 인간 감독의 필요는 AI 통합 기준을 구체화해요. 연구자와 정책가에게 관계 중심 설계, 디지털 유산 거버넌스, 설명가능·책임가능 AI의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심전도로 농촌의 심방세동을 잡다: 비용효과와 형평성을 모두 잡은 혁신
From Journal of Medical Systems: Universal Atrial Fibrillation Screening Using Electrocardiographic Artificial Intelligence: A Cost-Effective Approach in Rural Communities[2]
논문 요약
이 연구는 12유도 AI-ECG를 활용한 보편적 AF 스크리닝이 농촌 지역에서 의사 주도 스크리닝만큼 효과적이면서 더 저렴한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평가했어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마르코프 모형에서 AI-ECG는 무검진 대비 $4,349/QALY, 의사 스크리닝 대비 $6,132/QALY로 비용효과적이었습니다. 두 전략 모두 WTP($32,327/QALY) 이내였으며, AI 전략의 가치는 양성 후 전문의 의뢰율에 크게 좌우되었네요. 논문은 AI-ECG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격차를 줄일 실용적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왜 읽어야 해?
의료 AI 윤리 연구자에게 본 논문은 ‘형평성 있는 접근’과 ‘사회적 효율성’이 어떻게 만나 정책 결정으로 번역되는지를 보여줍니다. AI-ECG가 무검진·의사진료 대비 충분히 낮은 ICER을 보여 농촌 고령층에서 정의·선행을 동시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해요. 또한 양성 후 의뢰율이라는 실행 요인이 비용효과성과 윤리적 정당성의 관건임을 명확히 제시해, 프로그램 설계에서 책임성과 접근성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 스크리닝·인프라 구축 등 향후 연구·정책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네요.
여성의 재생산 정신건강을 위한 다중모달 AI 혁명: 공정성과 윤리를 향한 새로운 길
From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Multimodal large language models for women’s reproductive mental health[3]
논문 요약
이 논문은 여성의 재생산 생애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다중모달 대형언어모델(MLLM)로 다루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요. 월경, 임신·유산, 산후, 폐경, 난임, PCOS/자궁내막증 등 7개 영역에서 위험예측, 종단 모니터링, 임상결정지원, 맞춤형 교육의 활용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동시에 편향, 프라이버시·동의, 종단 데이터 표준화, 레지스트리 구축 같은 핵심 전제조건과 제약을 정리했어요다. 결과로 책임 있고 공정한 배치를 위한 평가·거버넌스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왜 읽어야 해?
재생산 데이터는 민감하고 법적 위험이 커 윤리적 설계 없이는 AI 도입이 불가능하지요. 본 논문은 MLLM이 제공할 수 있는 정밀 위험층화와 맞춤형 지원의 기회를 제시하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편향 완화, 프라이버시 보존형 학습, 표준화된 다중모달 레지스트리의 필요조건을 구체화했어요. 임상의·개발자·정책가가 협업해 안전하고 형평한 여성 재생산정신건강 AI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디지털 헬스 트윈, 윤리와 돌봄의 경계를 묻다
From JMIR Aging: Ethical and Quality of Care–Related Challenges of Digital Health Twins in Care Settings for Older Adults: Scoping Review[4]
논문 요약
이 주제범위 고찰은 노인 돌봄에서 디지털 헬스 트윈(DHT)의 적용을 망라해 윤리와 치료의 질에 관한 핵심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데이터 보안·프라이버시, 형평성·접근성, 맥락 의존적 효과성, 자율성·동의·과잉진단, 워크플로와 업무부담 등 다섯 축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자들은 환자 중심 거버넌스와 실천적 윤리지침·정책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향후 연구는 접근성·적시성·수용성·적정성 등 품질 차원을 포함한 실증 평가가 필요하겠지요.
왜 읽어야 해?
DHT는 노인 맞춤 돌봄을 크게 향상시킬 잠재력이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과잉진단, 접근성 격차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본 리뷰는 실제 도입 시 직면할 윤리·품질 리스크를 다섯 범주로 명확히 제시해 설계·정책·임상 구현의 우선순위를 제공했어요. 환자 자율성과 형평성 보장을 전제로 한 데이터 거버넌스, 인간-중심 동의 절차, 임상 캘리브레이션, 직원 교육·훈련의 필요가 강조되었네요. 무엇보다, 윤리적으로 안전한 DHT 확산을 위해 정책 입안자와 개발자, 임상의의 공동설계와 실증 검증이 필수적일 거예요.
의학 속 ChatGPT,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
From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London, England): Current concerns and future directions of large language model chatGPT in medicine: a machine-learning-driven global-scale bibliometric analysis[5]
논문 요약
이 논문은 전 세계 의학 분야에서 ChatGPT 연구의 성장 추세와 협업 양상을 계량서지(bibliometric) 및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했어요. 내과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외과·영상의학·공중보건·종양학 등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종양 환자관리/의사결정은 새로 떠오르는 주제이며, 건강정보 추천의 정확성·안전성 연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윤리는 성숙 단계지만 과제가 남아 있고, 의학교육과 임상결정지원은 높은 관련성 대비 저발달 영역으로 미래 연구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제시했어요.
왜 읽어야 해?
의료 AI 연구자들은 어느 임상 분야와 주제가 과소·과대 대표되는지, 그리고 향후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기반 지침을 논문에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의학교육과 임상결정지원에서 ChatGPT의 잠재력이 크며, 정확성·안전성 검증 프레임과 윤리 쟁점 정리가 시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불균형이 글로벌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어 정책과 국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네요.
Advancing health equity through inclusive medical AI: findings from an interdisciplinary workshop
From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Advancing health equity through inclusive medical AI: findings from an interdisciplinary workshop[6]
논문 요약
이 논문은 16개국 전문가 25명이 참여한 5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포용적 의료 AI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도출했어요. 합의된 우선과제는 당사자 경험 통합, 공정한 데이터 수집 설계, 인권을 보장하는 규제 프레임 구축이었습니다. 제안은 이해관계자 참여, AI 리터러시 강화, 윤리·규제 안전장치, 책임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어요. 포용성을 사후 보정이 아니라 설계 단계의 핵심 원칙으로 전환해야 건강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왜 읽어야 해?
의료 AI의 편향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행 지향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인권 기반 규제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AI 생애주기 전반에 내재화하는 프레임은 정책·거버넌스 설계에 직접적 함의를 제공하지요. 데이터 수집·거버넌스·책임성 강화 등 구체 영역별 제안은 연구자와 정책결정자에게 실천 가능한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형평성·포용성을 핵심 설계원칙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시스템적 전환 메시지는 향후 의료 AI 윤리 연구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있는 논문이에요.
AI가 그려낸 청소년 게임장애의 두 얼굴: 인지행동과 정신역동의 언어적 모사
From Psychiatric Quarterly: Cognitive-Behavioral and Psychodynamic Lenses on Adolescent Gaming Disorder Through AI-Generated Case Formulations: A Qualitative Analysis[7]
논문 요약
이 연구는 ChatGPT-4.0이 청소년 게임장애 사례에 대해 인지행동과 정신역동 관점의 공식화를 어떻게 모사하는지 질적으로 분석했습니다. 8개 표준화 비넷에 대한 출력에서 각각 3개(CBT)와 4개(정신역동) 하위유형을 도출하고, 공통 차원과 이론 간 차이를 맵핑했습니다. 결과는 LLM이 이론 기반 사고의 ‘구조’를 언어적으로 재현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실제 임상 추론을 대체하지 못하며 윤리적 감독이 필수임을 강조했어요. 결과적으로 논문은 LLM이 교육·수퍼비전에 한정한 보조 도구로의 가능성을 지닌다고 제안해요.
왜 읽어야 해?
정신건강 AI 윤리 연구자에게 본 논문은 LLM이 이론적 공식화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흉내 내는지’와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교육적 활용 가능성(통합적 사고 훈련, 틀 간 비교 학습)을 제시하면서도 과신, 편향, 책임성 부족 위험을 구체화했어요. 실제 임상 사례·다중 모델 비교·인간 공식화 대비 검증이라는 후속 연구 아젠다를 제공하여, 안전한 AI-보조 임상 추론의 경계와 조건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네요.
이번주 소식, 하이라이트
- 임종기 돌봄의 윤리는 자율성에 머물지 않고 환자의 서사·관계·사후적 디지털 흔적을 포괄하는 '사후 전기적 존엄'을 지향해야 해요.
- 의사 없이도 AI-ECG로 심방세동을 조기 발견—농촌 의료격차를 줄이는 스마트한 해법이 제시되었어요.
- AI가 월경부터 폐경까지, 여성의 삶 전 주기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 기술 혁신 속에서 인간다운 돌봄을 지키기 위한 다섯 가지 윤리 과제로 프라이버시부터 형평성까지를 검토해야 해요.
- 전 세계 의학 연구 지도를 통해 본 ChatGPT의 현주소는 내과에 집중된 관심 속, 임상결정지원과 의학교육이 미래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 AI는 정신건강 이론의 구조를 언어로 재현했지만, 인간의 임상적 통찰은 여전히 대체 불가해요.
이번주부터 바꾼 형식을 완전히 적용했어요. 약간 달라졌는데 어떠신지요? 더 재미있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엔 더 재미있는 헬스케어 AI 윤리 논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 위 요약은 AI로 자동 수집, 요약 후 LLM-as-a-Judge를 통해 평가지표 기반 상위 7개 논문·기사를 선정한 것입니다(사용 모델: GPT-5).
Reference
Abel García Abejas. Post-biographical dignit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Narrative, ePROMs and ethical challenges in end-of-life care.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https://doi.org/10.1017/S1478951525100990 ↩︎
Wei-Ting Liu. Universal Atrial Fibrillation Screening Using Electrocardiographic Artificial Intelligence: A Cost-Effective Approach in Rural Communities. Journal of Medical Systems. https://doi.org/10.1007/s10916-025-02287-9 ↩︎
Rawan AlSaad. Multimodal large language models for women’s reproductive mental health.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https://doi.org/10.1007/s00737-025-01633-7 ↩︎
Md Shafiqur Rahman Jabin. Ethical and Quality of Care–Related Challenges of Digital Health Twins in Care Settings for Older Adults: Scoping Review. JMIR Aging. https://doi.org/10.2196/73925 ↩︎
Song-Bin Guo. Current concerns and future directions of large language model chatGPT in medicine: a machine-learning-driven global-scale bibliometric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London, England). https://doi.org/10.1097/JS9.0000000000003668 ↩︎
Mirjam Plantinga. Advancing health equity through inclusive medical AI: findings from an interdisciplinary workshop.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https://doi.org/10.1093/eurpub/ckaf161.1282 ↩︎
Sarper İçen. Cognitive-Behavioral and Psychodynamic Lenses on Adolescent Gaming Disorder Through AI-Generated Case Formulations: A Qualitative Analysis. Psychiatric Quarterly. https://doi.org/10.1007/s11126-025-10231-w ↩︎